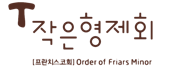by 고인현 도미니코 신부 ofm
아니마또레(이태리어): '보듬어 주고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자'를 의미합니다.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한 성모님을 ‘평화의 모후’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모후’(찬미받으소서 241항)로 모시며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생태적 회심(인간영혼과 자연의 회복)을 지향하는 온라인 기도방입니다。
----------------------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요한 3,18)
죄와 잘못은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것
예언자가 한 이런 말은 옳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 때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시편 1,4-5).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시편 1,5).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단죄를 받아,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시편 1,6). 죄와 잘못은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또다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대지를 품어 안은 엑카르트 영성) / 매튜 폭스 해제 · 주석
【둘째 오솔길】
버림과 그대로 둠
설교 18
지성을 버리면 지식의 변모가 일어난다
유대인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마태 2,2).
우리는 셜교 15를 설명하면서 엑카르트의 용어인 압게쉬텐하이트를 바오로의 로마서와 연관지어 규명한 바 있다. 본 설교에서 그는 자신이 사용한 그 용어의 또 다른 성서적 전거를 제시한다. 그는 마태오 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 마태오 복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만난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여기지 마시오, ..자식이 아버지를 거스르고 … 갈라 놓으러 왔습니다“(10,34-35). 본 설교에서 엑카르트는 이 말씀에다 자신의 해석을 끼워 넣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여기지 마시오. 나는 모든 것을 끊어 내고 … 자매와 형제 ....를 이간하는 칼을 주러 왔다. … 그가 끼워 넣은 단어는 압슈나이텐(끊어 내다)과 압샤이덴(분리시키다)이다. 이 단어들 모두 압게쉬덴하이트. 곧 버림의 어원이다. 이와 같이 엑카르트는 버림을 다른 피조물로부터 우리를 끊어 내는 칼로 보고 있다. 그는 버림이라는 개념을 로마서에 기록된 바오로의 말과 마태오 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어록에서 끌어내고 있다. 지식을 버리는 목적은 사실상 무에 이르기 위해서다. “순수한 버림의 목표는 무엇인가? 순수한 버림의 목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순수한 버림은 무를 목표로 삼을 따름이다. 순수한 버림의 최상의 목표는 하느님이 자신의 뜻대로 완전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 텅 빈 상태만이 하느님의 충만을 일으킨다. 버릴 줄 아는 마음이 최상의 목표로 삼는 것은 무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만 최고의 수용성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379)
<금주간 성서 읽기> 사도 15-19장
<생태 영성 주간> 고요와 침묵과 절식을 통한 단순한 삶
세계 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츤
제 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 4기 : 1300 ∼ 1500년
서구 통일 붕괴 시대의 교회
제 2절: 콘스탄츠 공의회와 공의회 우위설
요한 후스와 콘스탄츠에서의 그의 재판:
그 다음의 재판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들은 더욱 간파하기 힘들다. 공의회의 지도권은 다이이, 필라스트르, 자바렐라 추기경들과 파리 대학의 명예총장 제르송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에서 전혀 의혹이 없는 공의회의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독일인이 아니고 프랑스인이었으므로 민족적인 감정도 관계되어 있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코 “교황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고, 오히려 온건한 “공의회주의자’들이었다. 또한 요한 23세와 다른 이교 교황들의 맹렬한 반대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연구는 그들의 당파적인 편견을 비난하고, 그들의 재판 처리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었다(P. de Vooght). 후스는 이단자라는 비난에 단호히 저항하였다. 그의 저서에서 30개의 이단적인 명제가 그에게 제시되었다. 후스는 그것을 저술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그 이단적인 의미는 반박하고, 그것들을 정통신앙으로 해석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것들이 정통신앙이 아니라는 선서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그에게 적어도 그 오류적인 의미를 철회하는 선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결코 가르친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철회하는 선서를 할 수 없다고 응수하였다. 이렇게 끝이 없고 성과 없는 토론으로 재판관의 인내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의 격렬한 흥분과 극도로 자극된 전체적인 기운을 고려한다면, 사람들이 피고인을 이해하려고 한 것 못지않게 재판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하게 될 것이다. 피고에게 협상할 여유를 주고, “철회”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후스는 그러한 요구를 모두 완고하게 물리쳤다.
다이이와 자바렐라 추기경들이 지그문트 왕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7월 5일 감옥으로 후스를 방문하였다. 그에게 철회를 권고하였으나 보람없이 끝난 후,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 주교좌 성당에 모인 공의회 앞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여기에서 후스가 위클리프의 이단을 자신의 저서에서 “신조화하고 변호하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되었다. 같은 날 그는 화형에 처하기 위하여 형장으로 인도되었다. 그가 장작더미 위에 서 있을 동안 지그문트는 다시 한번 그에게 철회의 기회를 주었다. 그는 거부하였고.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신경을 외면서 사망하였다.
죄악과 비극성, 자신과 타인의 거절이 관련되어 그의 운명 안으로 함께 끌려들어 갔다. 공의회는 후스 문제를 가볍게 넘어갔다. 대부분의 참석지들에게는 그것이 지엽적인 사건에 불과하였다. 그들은 그것에 조금 주목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역시는 무섭게 후스의 복수를 하였다. 잔학한 후스 전쟁(1420~1431)은 보헤미아와 독일을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263)